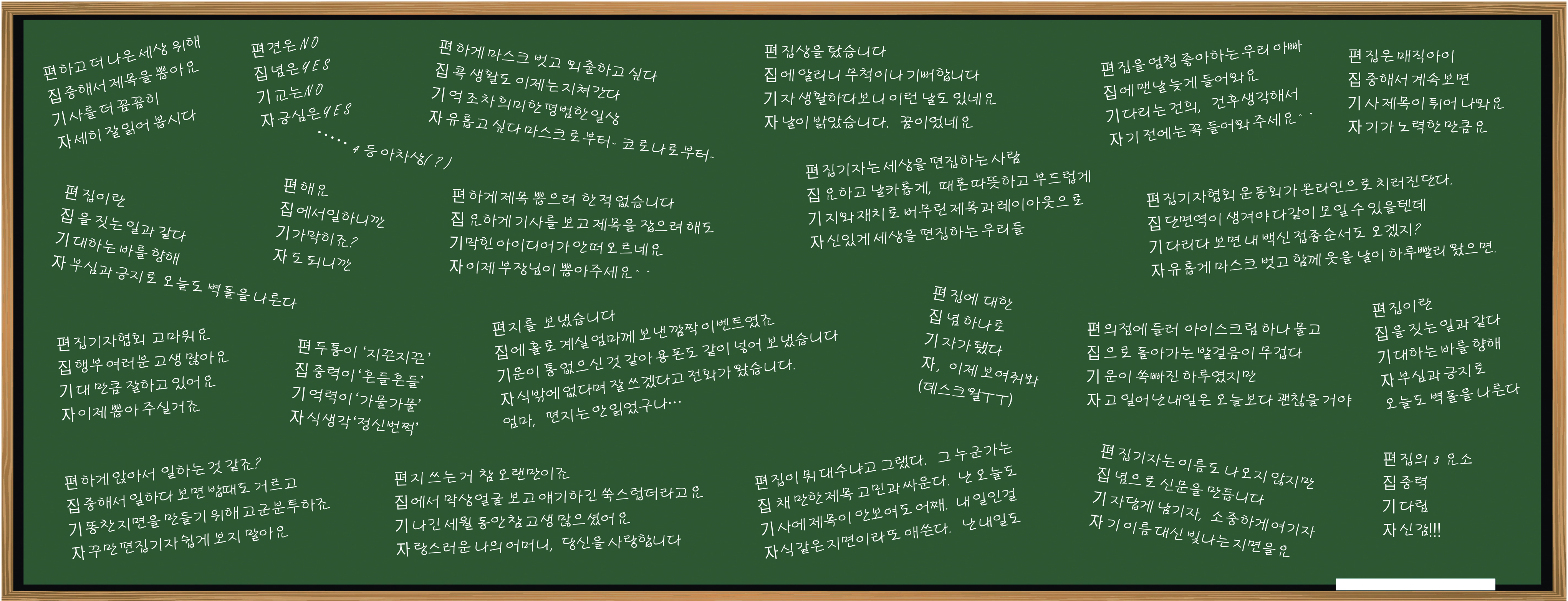
휴직중 1등... 눈치 없이 상 타서 죄송합니다
1등 경기일보 권경진 기자

육아휴직에 들어온 지 6개월이 지났다. 휴직을 한 상태이지만 커피쿠폰이라도 받고 싶어 도전했는데 덜컥 1등을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밥상’ 외엔 ‘상’이랑은 인연이 없었는데 감사하다.
육아에 코로나까지 겹쳐 집콕 신세다. 사회와 소통창구는 가끔 하는 인터넷. 오랜만에 들어간 편집기자협회 홈페이지 공모전이 눈에 들어왔다. 예전 같으면 엄두조차 안 냈지만, 공고를 본 순간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다. 사행시의 주제는 ‘편집기자’. 한참을 한 글자씩 보던 중 ‘집’이란 단어에 꽂혔다.
나는 집이 먼 장거리 출퇴근러다. 그래서 강판 후에는 다른 동료들보다 더 바삐 움직여야 했다. 불과 몇 초 차이로 길에서 버려야 하는 시간이 30분이 넘기 일쑤였다. 임신을 하고 차로 편도 한 시간이 넘는 거리를 몇 달간 오갔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다니면서 유독 예민해지는 순간이 있었다. 바로 ‘강판 후 재송’이였다. 그렇지 않아도 몸도 무겁고 갈 길은 먼데. 다시 일을 시작하는 그 기분. 편집기자의 숙명과도 같지만 일을 하면서 맥이 빠지는 건 사실이다. 사행시에서 ‘집’ ‘눈치 없이’ ‘재송’이란 단어로 편집의 고충을 녹였기에 공감을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기자들이 눈치 없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작 눈치 없는 건 나였다. 매일 지면과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료들도 있는데 휴직한 상태에서 상까지 받았으니 말이다. 이 자리를 빌려 편집부 부장님과 선후배들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옛 동료 ‘굿디터’ 식구들에게도 인사 전하고 싶다. 20살에 만나 지금까지 내 옆을 한결같이 지켜주는 신랑과 태명처럼 건강하게 태어나준 도윤이에게 모든 기쁨을 돌린다.
예상 못한 수상… '완전 대박' 좋았다, 무야호!
2등 디지털타임스 이정혜 기자

‘편안하게 달아볼까, 집요하게 달아볼까’ 사행시 또한 그러했다. 커피쿠폰 받으려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집요함이 섞여들었다. 한번 시작한 거 좀 잘하고 싶었다. 초고를 작성하고 친구들과 친언니 이정윤에게 컨펌을 받았다.
피드백은 “짧게해라”. 중구난방 어질러놓은 글에 알맞은 솔루션이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고치고 고치다 보니 결과물이 나왔다. 나름의 집요함이 잘 먹혀들은 건가 2등이 됐다.
목요일 오전 당선 전화를 받자마자 편집부 선배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막내가 큰일이라도 해낸 것처럼 다들 부둥부둥 오구오구 기특하게 여겨주셨다. 사행시가 뭐라고 민망하기도 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솔직히 진짜 완전 대박 좋았다. 협회보에 소감과 사진이 올라간다는 사실도 설렜다. 어떤 사진이 제일 괜찮을까부터 고민했다. 어쨌든 좋은 소식. 회의 끝나고 오신 부장에게도 알렸다. 대번에 하시는 말씀, “지면 제목을 그렇게 달아 이 새끼야” 후배 사랑이 듬뿍 담긴 축하 메시지였다.
사행시엔 편집기자로 일하는 내 모습이 담겨있다. 좀 편하게 일 하려다가도 잘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끈덕지게 업무에 임하는 시간들. 게으름과 열정이 공존하는 그런 하루.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도 잘은 모르지만 일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 열정만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엔 편집상 수상자로 협회보에 실려보고 싶다. 무야호!
초록창보다 신문, 그찐~한 매력 다시 느꼈으면
3등 아시아경제 권수연 차장

알람소리를 끄려 새벽부터 집어든 휴대폰. 그리고 바로 ‘초록창’을 열어 오늘의 날씨를 확인한 후, 혹시나 출근해서 나만 모르고 있을 밤사이 뉴스들은 없었는지, 검색해 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점심 먹고 아메리카노를 한손에 쥔 채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잠들기 직전 침대에 누워서까지 초록창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마치 ‘초록창’이 없이는 바깥 세상을 알 수 없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신문을 만드는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저에게조차도 ‘초록창’은 뉴스를 찾아보는 너무 당연한 채널이 돼버린 게 사실입니다.
매초마다 수없이 쏟아지는 세상 일들을 제일 빠르게, 가장 손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초록창 뉴스’의 스피드함에도, 그 방대한 양에도 맞설 순 없지만, 신문은 분명 초록창에서는 검색되지 않는 ‘편집이라는 매력’이 존재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에게 그 매력이 잘 어필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패스트푸드와 손쉬운 배달음식을 매일 먹다가 오래시간 제대로 정성들인 집밥을 먹었을 때 “아! 역시” 하고 그 잊고 있던 진한 맛을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지요. 어느 날 집어 든 신문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느리지만 인상 깊게’ 세상을 알아가는 집밥 같은 찐~한 매력을 사람들이 다시 느껴주면 참 좋을텐데 말입니다.
편의점에 들러 담배 한 갑 대신 신문 한부를, 문 앞에 택배상자보다 아침신문을, 더 반기며 찾아주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기를 바라는 맘을 이번 사행시에 담아봤습니다. 아마도 이런 씁쓸한 마음을 공감해 주셨던 거 같습니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